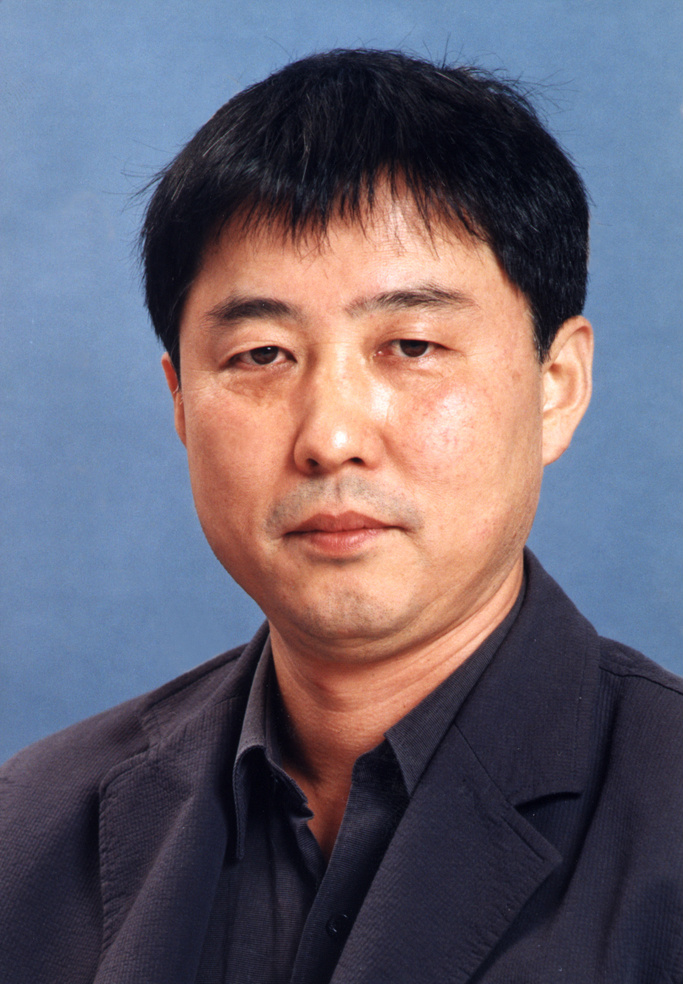 |
||
| ▲ 김영욱 위원 | ||
좀 지났지만,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사망에 대한 보도는 그 전형적인 예처럼 보였다. 급격히 늘어나는 한국의 자살률의 곡선을 꺾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04년 7월 언론의 자살 보도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살은 전염되며, 그 중요한 매개체가 언론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기자협회보가 반복해서 전파했고, 나도 이 난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은주씨의 사망에 대한 보도(2월 23일)에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은 “이동식 옷걸이에 넥타이로 목매어 자살”했다며 자살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서울신문은 이동식 옷걸이에 벨트로 목을 매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들은 손목을 칼로 그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칼이 연필깎이 칼(혹은 ‘커터’)이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이들 신문들은 또한 피로 쓴 글씨와 유서 사진을 실었다.
자살 사건 보도에서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피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자살 방법이나 정황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이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했다.
그렇다면 자살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허사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을 매 숨진 채로 오빠(28)에게 발견되었다” 정도로만 자살 방법을 묘사했고, 본문에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이 신문은 칼을 ‘흉기’로 표현해, 구체적인 도구를 밝히지 않았다. 유서 사진도 없었다.
이 사건 보도에서 가장 돋보이는 신문은 한겨레(김기성 기자)였다. 기사 크기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자살 방법에 대한 묘사도 없었다. 한겨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옷방에 들어가 보니 이씨가 숨져있었다” 등으로 표현하는 정도였다.
본문에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로 쓴 글씨나 유서 사진을 싣지 않았다. 아쉽게도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젊은 영화배우의 자살을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며 정당하다. 그러나 ‘이동식 옷걸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었다’거나 ‘연필깎이 칼로 손목을 그은 흔적이 있었다’와 같은 내용은 사건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며, 모방 자살을 부를 위험이 있다.
실제 그 후 유사한 자살 사건도 있었다. 한겨레가 독자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선정적 보도가 가져오는 모방 자살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은주씨 사망 보도 이후 유난히 많은 자살 보도가 있었다. 자살이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실제 자살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 보도 방식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언론 보도 방식이 한 사람에게서라도 자살을 실행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그 책임을 줄일 수도 있었다. 그 방법을 한겨레가 보여준 것이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