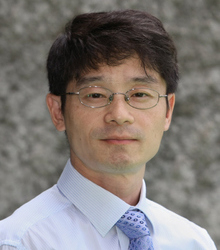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
‘박원순 사건’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작동한다. 사실과 주장, 허위가 있다. 사실-피해자가 장기간 성추행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주장-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그동안 당한 성추행 내용 일부를 알렸다. 이 주장들은 피해 호소, 보직변경 요청 등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영역과 박 시장과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진 ‘확인 불가’ 영역으로 또 나뉜다. 확인 불가 영역이라도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도 이런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외에 피해자 쪽도 부인했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고소장 및 가짜뉴스 등 허위의 영역이 있다. 사실, 주장, 허위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확인을 거치면 주장이 사실이 되기도 하고, 허위도 출처가 명확하면 주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에 ‘사실’의 옷을 입히거나, 사실-주장-허위를 구분 않고 혼재된 상태를 발판으로 논지를 펴나가면, 옷을 거꾸로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합리적으로 불편했다.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적용 원칙이다. 이에 부합할 언론 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더 적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야 할 언론 원칙은 ‘약자 우선’이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존재 이유다. 서울시장과 비서의 말이 맞선다면(지금은 맞서지도 않지만), 우선 ‘비서’ 쪽이 언론의 자리다.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어느 순간, 한국 언론은 ‘우리편’ 또는 ‘아는 사람’에게 훨씬 우호적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은, 사적 공간에서는 중력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념과 정의로 똘똘 뭉쳐 누구에게나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친구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허물도 감싸주는 사람이다.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남성은 누구나 성폭행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간다. 여성은 누구라도 크고 작은 성폭력을 안 겪은 이가 드물다. 명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 호소인, 피해자’ 용어 시비를 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또다른 ‘위력’이자 ‘완력’이다. 혹자는 반대로 매카시즘을 거론하며 ‘젠더가 권력’이라고 항변한다. 기득권자의 무기였던 ‘레드’를 ‘젠더’와 같은 반열에 놓는 건 불공정이다. 기득권자일수록 때론 합리가 아닌, 의지로 (약자에게) 공감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책무인 팩트파인딩까지 백래시로 여기진 말아야 할 것이다. 분노를 전달하기도 해야 하지만, 요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언론은 주장을 사실과 허위로 구분해 줘야 한다.
ps. 페이스북은 격전장이다. 울분과 격정에 휩싸인, 논리정연한 글들에 때론 끄덕였다. 하지만 안다. ‘아재, 아짐의 시대는 갔다’. 마흔 즈음에 <서른 즈음에>를 부르며, 청춘을 연장해 왔던.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