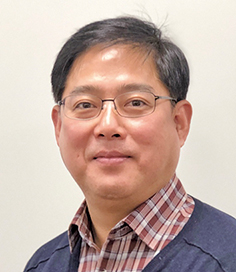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
자전거길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4박 5일 여정에서 하루 평균 만난 사람은 3~4명. 식당 이모님과 모텔 사장님, 편의점 알바 정도였다. 무인텔에서 잘 때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저절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뤄졌고, 꽃구경만큼은 원 없이 했다.
서울 집에서 낙동강 하굿둑까지 550㎞를 가는 동안 넘은 큰 고개는 5개다. 충북 수안보와 괴산을 잇는 소조령, 경북 문경으로 가는 관문인 이화령, 낙동강 무심사길, 경남 의령 박진고개, 창녕 영아지 고개. 이 다섯 고개를 빼면 대체로 평탄했다.
무아지경으로 페달을 밟아가는 중에 가끔 상념이 떠오르곤 했는데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가파른 오르막에 접어들라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곧이어 다리가 풀린다.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정 안 되겠거든 걸어서라도 가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바이크를 끌고 오르는 것을 동호인들은 ‘끌바’라고 한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여정에는 평탄한 길보다 힘겨운 오르막이 훨씬 더 많다. ‘끌바불사’의 자세로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개는 넘게 될 것이다.
평지를 달릴 때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지만, 긴 오르막을 넘으려면 경사도와 허벅지 사정에 맞춰 수시로 기어를 바꿔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억센 중력이 여지없이 바퀴를 멈춰 세운다. 맞바람이 거셀 때도 기어를 바꿔주면 한결 낫다. 남북관계는 세계와 동북아 정세의 일부다. 지정학적 중력과 바람이 항시 작용한다. 남북한의 필요와 희망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함께 고려하며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구사하고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내리막길은 힘은 안 들지만 위험하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속도감을 즐기느라 넋을 놓으면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의 앞 브레이크를 급히 잡으면 그대로 뒤집혀 쇄골이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흔하다. 바로 이런 사고로 작년 가을에 갈비뼈 세 대가 부러졌다. 뒤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잡으면 중심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넘어지기 일쑤다. 이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남북관계가 순항할 때에도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페달을 계속 밟는 것이다. 나아가는 한 넘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대화와 교류 제의에도 북한은 ‘자력부강’의 구호만 외칠 뿐 대답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부산에 도착해 벚꽃 만발한 낙동강 제방 위를 달릴 때는 팡파르처럼 꽃비가 내렸다. 남북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