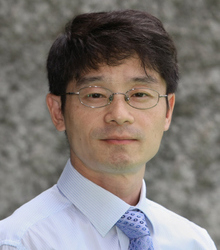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지만, ‘한·일 후세에 대한 교육’ 등 위안부 운동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할머니의 지적은 본질이 아닌, 방법론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은 옥석을 가려줘야 한다.
먼저 윤미향 의원을 보자. 회계부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횡령 부분은 의혹을 제기할 여지는 있되, 근거는 없다. 현재까진. 그래서 제목 등을 통해 횡령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는 언론의 정파성을 강화할 뿐이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에서 개인비리가 드러날 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완전 봉쇄하는 식의 보도 또한 적절치는 않을 것이다. 횡령이든 결백이든, 언론이 팩트없이 ‘확신’에 찬 보도를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정의연에 대해선, 수요집회와 소녀상 건립으로 대표되는 기존 운동 방식에 대해, 지금까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 한 번도 회의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정의연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미안함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정의연의 과잉대표성을 거론하곤 하지만, 여기에는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도외시한 정부의 무책임을 먼저 꼽아야 한다. 지금 정의연의 과잉대표성을 논하는 건 그간의 흐름(flow)을 보지 않고, 현 시점의 상황(stock)에만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으로 비친다.
이와 함께 이용수 할머니가 던져준 가장 큰 물음은 피해자들의 주체성 요구다. 이용수 할머니는 회견에서 자신을 ‘여성인권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그간 위안부 할머니는 불쌍한 존재, 돌봄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 도식을 깨고 정책 결정자(decision maker)가 되기를 원한다. 위안부 운동뿐 아니라, 모든 시민운동에서 혹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및 정의연의 일부 부실회계 등을 발판삼아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를 다 뒤집어엎으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22년 전 ‘영혼 결혼식’ 기사를 끄집어내 조롱하는 행태는, 바닥을 드러낸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수와 윤미향에게서 ‘욕망’을 본다.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국회의원이 되려 시도한 것과 2020년 윤미향 전 이사장의 국회 입성에는 모두 ‘공적 책무’가 그 동인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 속 한편에 개인적 욕심 또한 왜 없었겠는가. 이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순 없을까. 가끔 언론에 ‘순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때 ‘순수한’이란, 개인적 욕심은 초탈한 성인의 모습, 아니면 너무 순진해 세상사에는 무지한 상태를 뜻하고, 이를 최고로 상찬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 사람이다.
‘나눔의 집’이 혜화동에 있을 때인 1995년 무렵, 사회부 기자로 그곳을 취재한 적 있다. 한 할머니가 “나는 소원 그거 밖에 없어, 그래 배가 불룩하이 아(아기) 하나 낳아 봤으면…, 제일 그기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위안부 시절을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며 울부짖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다. 언론이 이 사안을 정파적으로, 혹은 조회수로만 다뤄선 안 될 이유 중 하나다.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