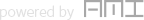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물론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의견 변화가 오로지 언론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순 없다. 과거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이 강력하게 이슈 투쟁을 한 점도 있고, 과거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이미 승패가 한 번 갈렸던 이슈라는 점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 향배가 자신이 주로 소비하는 미디어에 강력하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파와 종편 등을 소비하는 이들과 팟캐스트를 비롯한 대안 언론을 소비하는 이들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일부러 해당 매체를 찾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히 대안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언론을 소비한다고 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류 언론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팟캐스트를 비롯한 대안언론을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이들 시청층의 적극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주류 언론의 위기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따라 예고된 것이었다. 10여 년 전 지상파 관련 세미나의 주제 상당수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상파가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남을 것인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의 위기란 주로 플랫폼에 관한 것이었지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위기라고 말은 하면서도 늘 그랬듯이 새로운 플랫폼을 막강한 자본으로 흡수해내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4.16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뉴시스>
물론 정권이 교체되어 지상파가 과거처럼 보다 균형적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중 상당수는 다시 지상파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미 지상파에서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직설적인 표현방식에 익숙해져버린 이들이 점잖은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상파에 과연 과거와 같은 충성도를 가질지 의문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해서 생존하고자 했던 종편들 역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이신문이란 한계를 극복하긴 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과거 종이신문 시절보다 훨씬 더 특정 시청층에만 소구하고 있다. 더구나 그 특정 시청층이란 게 주로 장노년층에 국한되어 있어 주 소비계층인 20~40과는 더 멀어져버렸다.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주류 언론 영향력 감소는 매체 환경의 변화보다는 균형적 보도를 포기한 스스로에게 더 많이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기야 ‘관보’처럼 재미없는 게 또 어디 있을까? 오래전 서구 언론들이 ‘(기계적) 균형’을 표방했던 애초의 이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류 언론들이 다시 떠올려봐야 할 때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