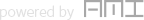시민단체 낙선운동 보도가 널뛰고 있다.
경실련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계획을 알고 있던 어느 언론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발표가 있자 대부분 양비론을 택했다. 또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지지로 조사된 후와 선관위의 불법 대응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독자의 혼란을 부추겼다.
시민단체 비판론을 고수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위헌'을 들어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판관임을 자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김대중 주필은 15일자 '낙선운동 감상법' 칼럼에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토를 달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측은 집권 여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경실련 명단을 싣지 않으면서도 기준과 설명을 밝히지 않았을뿐더러 명단의 부적격 이유도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 편집국의 한 기자는 "(신문에서) 딴죽거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불필요한 거부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안된다는 식의 강한 논법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론을 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보도 태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11일자 '알림'을 통해 "공천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지만 시민 공천감시권과 헌법상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조선일보와 대조를 이루었다.
또 처음부터 적극 지지를 밝힌 한겨레에 버금가는 입장으로 변화한 중앙일보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11일자 '낙천운동 기준이 문제다'는 사설에서 14일자 '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유승삼 칼럼)로 급선회한 과정에는 8대2로 찬성이 압도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국민일보는 11일자 초판에서 경실련 명단을 실었다 타사 신문을 보고 시내판에서 빼는 난맥상을 보여 보도 기준의 부재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박정삼 편집국장의 경위 설명이다. "오전 회의에서 경실련 명단을 일단 싣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고 시기적으로 총선 시민연대가 뜨기 전이라 경실련 자료가 실리게 되면 앞으로 시민단체 발표는 다 실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초판 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신문이 명단을게재할것이라는정보를 듣고 불가피하게 실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타사 초판 신문들을 보니 안 싣는 데도 있길래 다시 부장단 회의를 거쳐 명단을 빼기로 결정했다. 대신 초판엔 스트레이트와 해설에서 가치판단보다는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춰 썼지만 명단을 빼면서는 기사에서 경실련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기사는 더 강화됐다."
이같은 보도 논란에 대해 낙선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차갑다.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언론자유라기보다는 '권익'을 마음껏 누려온 언론이 명단보도를 외면한 것은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의 눈총까지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냉소적인 목소리이다. "총선 부적격자 명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양분을 극대화해서 보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한 명단에 공신력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자신들의 기사 공신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이다."(경실련 시민입법부 김영재 간사) "위법 여부를 따지자면 외국의 경우를 소개했어야 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기준만을 놓고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 "정치부 기자들의 직무유기이다. 이 운동을 왜 사회부나 NGO담당 기자들만 취재하는가. 선거법이나 공천문제는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왜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펼치는지, 선거법 87조의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배경 설명없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듯 이벤트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양세진 총선시민연대 공동 사무국장.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간사)
김일/김상철/김현의 전체기사 보기
경실련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계획을 알고 있던 어느 언론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발표가 있자 대부분 양비론을 택했다. 또 시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지지로 조사된 후와 선관위의 불법 대응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독자의 혼란을 부추겼다.
시민단체 비판론을 고수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위헌'을 들어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판관임을 자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김대중 주필은 15일자 '낙선운동 감상법' 칼럼에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토를 달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측은 집권 여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경실련 명단을 싣지 않으면서도 기준과 설명을 밝히지 않았을뿐더러 명단의 부적격 이유도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 편집국의 한 기자는 "(신문에서) 딴죽거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불필요한 거부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안된다는 식의 강한 논법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론을 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보도 태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11일자 '알림'을 통해 "공천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지만 시민 공천감시권과 헌법상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조선일보와 대조를 이루었다.
또 처음부터 적극 지지를 밝힌 한겨레에 버금가는 입장으로 변화한 중앙일보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11일자 '낙천운동 기준이 문제다'는 사설에서 14일자 '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유승삼 칼럼)로 급선회한 과정에는 8대2로 찬성이 압도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국민일보는 11일자 초판에서 경실련 명단을 실었다 타사 신문을 보고 시내판에서 빼는 난맥상을 보여 보도 기준의 부재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박정삼 편집국장의 경위 설명이다. "오전 회의에서 경실련 명단을 일단 싣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고 시기적으로 총선 시민연대가 뜨기 전이라 경실련 자료가 실리게 되면 앞으로 시민단체 발표는 다 실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초판 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신문이 명단을게재할것이라는정보를 듣고 불가피하게 실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타사 초판 신문들을 보니 안 싣는 데도 있길래 다시 부장단 회의를 거쳐 명단을 빼기로 결정했다. 대신 초판엔 스트레이트와 해설에서 가치판단보다는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춰 썼지만 명단을 빼면서는 기사에서 경실련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기사는 더 강화됐다."
이같은 보도 논란에 대해 낙선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차갑다.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언론자유라기보다는 '권익'을 마음껏 누려온 언론이 명단보도를 외면한 것은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의 눈총까지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냉소적인 목소리이다. "총선 부적격자 명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양분을 극대화해서 보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작성한 명단에 공신력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자신들의 기사 공신력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이다."(경실련 시민입법부 김영재 간사) "위법 여부를 따지자면 외국의 경우를 소개했어야 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기준만을 놓고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 "정치부 기자들의 직무유기이다. 이 운동을 왜 사회부나 NGO담당 기자들만 취재하는가. 선거법이나 공천문제는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왜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펼치는지, 선거법 87조의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배경 설명없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듯 이벤트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양세진 총선시민연대 공동 사무국장.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간사)
김일/김상철/김현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