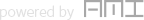이성철 SBS 사회부 기자
필자가 이땅에 태어난 때는 31년전인 1968년 8월이다. 무척이나 더웠다던 바로
그해 여름 한반도의 허리 비무장지대에서는 울창한 초목들이 말라 죽어갔다.
죽음의 살초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맞으며.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살포작전에 동원된 장병들은 살초제 범벅이 된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미군
덕분에 고된 낫질을 안하게 됐다고 고마워 했을 것이다. 그리곤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그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999년 11월, 그때 그 살초제는 고엽제라는
유령으로 다시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국에도 고엽제가 뿌려졌다는데...”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의 한마디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미국의 농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난 9월 30일이었다. 한달 반에 걸친 고엽제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곧바로 추적에 들어가 때마침 한국에 와 있던 정에스라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주한미군 출신인 토머스 울프 씨를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한 미국 보훈성의 결정문과 살포 사실을 확인한 미 육군성의
서한은 이때 입수한 것이다.
데스크에 보고하자 미국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울프 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라는 것이었다. 오하이오 데이턴의 땅을 밟게 된 때는 지난달 6일.
설렘 반 두려움 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퇴역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울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DMZ 고엽제 살포작전의 전모를 기록한 비밀문서 <68년 초목관리계획>은 여기서
입수한 것이다.
울프씨를 통해 다양한 취재원과 접할 수 있었다. 먼저 68~69년 주한미군 중대장
출신인 벤보우 변호사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주한미군 출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취재진이 머물고 있던 데이턴 근교에
사는 고엽제 살포 목격자인 동료 중대원을 소개해 줬다. 60년대말~70년대초
주한미군 출신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다른 두 사람 또한 이들의
소개로 전화 인터뷰까지 할 수 있었다.
5박6일간의 현지취재를 마치고 귀국했다.이제는국내의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는
게 숙제였다. 사건팀 후배기자 2명과 함께 ‘오렌지팀’을 짜 비밀문서 번역과
함께 살포작전 일지 재구성, 군 관계자 추적에 들어갔다.
당시 군 고위층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지만 사단장, 화학장교, 소대장의
증언이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접 살포한 사람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도 예정일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 관할지역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것으로 비밀문서에 기록된 ‘98전투단’ 장병을 찾기로 하고 급기야 데스크의
결단으로 이틀에 걸쳐 텔레비전에 자막을 내보냈다. 제보전화가 빗발쳤고
보도당일 저녁 7시쯤 고엽제 드럼통을 운반했던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45일간에 걸친 사전취재를 마치게 됐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출장을
다녀온 뒤 미국 보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첫 보상결정을 받은
울프씨는 물론, DMZ 고엽제 피해자라며 보상을 청구했다 기각된 주한미군 출신
여러 명에 대한 결정문이 숨어 있었다.
또다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국내 고엽제 살포에 관한 글이 적잖이 올라
있었다. 전자우편을 띄웠더니 답장이 왔고 이를 통해 비밀문서에서 빠져 있던 한
페이지를 구할 수 있었다.
대학시절 영자신문 The Granite Tower 기자로 영어취재 훈련을 해둔 것도 꽤
도움이 됐다.
DMZ 건너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 불행했던 역사의 한구석을 이제나마
조명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부디 한미 두나라 정부가 침묵해온 동안
고엽제에 노출된 사실조차 모른채 숨져간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새천년 맞이에 떠들썩한 1999년 말, 지난 천년동안 우리에게 어떤일이 있었고 또
지난 반세기 냉전의 땅 한반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철의 전체기사 보기
필자가 이땅에 태어난 때는 31년전인 1968년 8월이다. 무척이나 더웠다던 바로
그해 여름 한반도의 허리 비무장지대에서는 울창한 초목들이 말라 죽어갔다.
죽음의 살초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맞으며.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살포작전에 동원된 장병들은 살초제 범벅이 된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미군
덕분에 고된 낫질을 안하게 됐다고 고마워 했을 것이다. 그리곤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그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999년 11월, 그때 그 살초제는 고엽제라는
유령으로 다시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국에도 고엽제가 뿌려졌다는데...”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의 한마디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미국의 농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난 9월 30일이었다. 한달 반에 걸친 고엽제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곧바로 추적에 들어가 때마침 한국에 와 있던 정에스라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주한미군 출신인 토머스 울프 씨를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한 미국 보훈성의 결정문과 살포 사실을 확인한 미 육군성의
서한은 이때 입수한 것이다.
데스크에 보고하자 미국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울프 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라는 것이었다. 오하이오 데이턴의 땅을 밟게 된 때는 지난달 6일.
설렘 반 두려움 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퇴역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울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DMZ 고엽제 살포작전의 전모를 기록한 비밀문서 <68년 초목관리계획>은 여기서
입수한 것이다.
울프씨를 통해 다양한 취재원과 접할 수 있었다. 먼저 68~69년 주한미군 중대장
출신인 벤보우 변호사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주한미군 출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취재진이 머물고 있던 데이턴 근교에
사는 고엽제 살포 목격자인 동료 중대원을 소개해 줬다. 60년대말~70년대초
주한미군 출신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다른 두 사람 또한 이들의
소개로 전화 인터뷰까지 할 수 있었다.
5박6일간의 현지취재를 마치고 귀국했다.이제는국내의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는
게 숙제였다. 사건팀 후배기자 2명과 함께 ‘오렌지팀’을 짜 비밀문서 번역과
함께 살포작전 일지 재구성, 군 관계자 추적에 들어갔다.
당시 군 고위층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지만 사단장, 화학장교, 소대장의
증언이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접 살포한 사람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보도 예정일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 관할지역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것으로 비밀문서에 기록된 ‘98전투단’ 장병을 찾기로 하고 급기야 데스크의
결단으로 이틀에 걸쳐 텔레비전에 자막을 내보냈다. 제보전화가 빗발쳤고
보도당일 저녁 7시쯤 고엽제 드럼통을 운반했던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45일간에 걸친 사전취재를 마치게 됐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출장을
다녀온 뒤 미국 보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첫 보상결정을 받은
울프씨는 물론, DMZ 고엽제 피해자라며 보상을 청구했다 기각된 주한미군 출신
여러 명에 대한 결정문이 숨어 있었다.
또다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국내 고엽제 살포에 관한 글이 적잖이 올라
있었다. 전자우편을 띄웠더니 답장이 왔고 이를 통해 비밀문서에서 빠져 있던 한
페이지를 구할 수 있었다.
대학시절 영자신문 The Granite Tower 기자로 영어취재 훈련을 해둔 것도 꽤
도움이 됐다.
DMZ 건너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 불행했던 역사의 한구석을 이제나마
조명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부디 한미 두나라 정부가 침묵해온 동안
고엽제에 노출된 사실조차 모른채 숨져간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새천년 맞이에 떠들썩한 1999년 말, 지난 천년동안 우리에게 어떤일이 있었고 또
지난 반세기 냉전의 땅 한반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철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