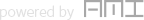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른바 '중앙일보 사태'는 언론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불러 일으켰다. 사주 1인이 전횡하는 신문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만 언론민주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고 언론발전위원회(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간법 개정과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국회의 공론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6월 9일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명칭은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더라도 방송개혁이 완결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신문과 방송을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구태여 신문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또 개혁은 궁극적으로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혁기구의 명칭을 '언론발전위원회'로 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순수 민간기구로 허친스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했으며 영국에서는 정부와 의회의 주도로 왕립위원회와 캘커트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타율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 모두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허친스위원회에서 제안한 신문평의회는 극소수의 지방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제안사항도 사장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순수 민간기구로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아무리 좋은 발전 방안이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왕립위원회처럼 정부 주도로 구성할 경우 한국에서는 역사적 맥락으로 보아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회 산하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여야의원들은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1회성 제안으로 끝내지 말고 스스로 공론화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언론발전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대표들이참여한다면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루느냐일 것이다. 원칙적으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신문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또 문란한 신문시장질서를 바로잡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광고 및 판매시장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 또는 규제하고 신문발행부수공사(ABC) 제도나 공동판매 제도의 실시를 유도하며, 나아가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할 있는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언론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언론인 연금제도 도입, 언론인 재교육 활성화, 취재관행의 개선, 언론윤리의 확립방안 등 각종 언론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전담법원의 설립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언론사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할 대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천년을 맞는 우리 언론의 철학적 기반을 가다듬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신문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언론은 나름대로의 철학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지지 못했다. 초기에는 계몽주의적 언론관이 지배했으며 일제시대에는 지사적 언론관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녔다. 해방이후에는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언론자유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고 문민정부 이후에는 언론의 권력화 현상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아 한국언론의 역할과 위상 등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언의 전체기사 보기
이른바 '중앙일보 사태'는 언론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불러 일으켰다. 사주 1인이 전횡하는 신문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만 언론민주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고 언론발전위원회(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간법 개정과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국회의 공론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6월 9일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명칭은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더라도 방송개혁이 완결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신문과 방송을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구태여 신문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또 개혁은 궁극적으로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혁기구의 명칭을 '언론발전위원회'로 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순수 민간기구로 허친스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했으며 영국에서는 정부와 의회의 주도로 왕립위원회와 캘커트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타율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 모두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허친스위원회에서 제안한 신문평의회는 극소수의 지방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제안사항도 사장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순수 민간기구로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아무리 좋은 발전 방안이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왕립위원회처럼 정부 주도로 구성할 경우 한국에서는 역사적 맥락으로 보아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회 산하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여야의원들은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1회성 제안으로 끝내지 말고 스스로 공론화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언론발전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대표들이참여한다면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루느냐일 것이다. 원칙적으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신문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또 문란한 신문시장질서를 바로잡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광고 및 판매시장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 또는 규제하고 신문발행부수공사(ABC) 제도나 공동판매 제도의 실시를 유도하며, 나아가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할 있는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언론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언론인 연금제도 도입, 언론인 재교육 활성화, 취재관행의 개선, 언론윤리의 확립방안 등 각종 언론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전담법원의 설립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언론사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시민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할 대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천년을 맞는 우리 언론의 철학적 기반을 가다듬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신문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언론은 나름대로의 철학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지지 못했다. 초기에는 계몽주의적 언론관이 지배했으며 일제시대에는 지사적 언론관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녔다. 해방이후에는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언론자유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고 문민정부 이후에는 언론의 권력화 현상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아 한국언론의 역할과 위상 등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