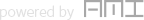현재 신문개혁위원회 또는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방안은 모두 3가지 정도다. 첫째,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의 형태, 둘째, 국회결의에 의한 위원회 형태, 셋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산하 위원회 형태가 그것이다. 학계와 언론계 모두 대체로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대통령 혹은 정부기구 형태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 형태. 이는 설립된 기구를 통해 논의한 사안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회법 제43조에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과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5공비리척결위원회' 등 국가적 사안이 아닌, 민간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구성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문화관광위 산하 위원회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한계는 문화관광위 내부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다수의 본회의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논의 결과를 현실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언개연이 국민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한다는 원칙 아래 언론학자, 법학자, 경영학자, 시민단체 대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하부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기한 바 있다. 언개연은 운영위원회 구성시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된 조합주의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또한 박용규 교수(상지대 신방과)는 현업종사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자 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구성원에 포함될 경우 당리당략이 논의에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지의 전체기사 보기
현재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한 위원회 형태. 이는 설립된 기구를 통해 논의한 사안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회법 제43조에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과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5공비리척결위원회' 등 국가적 사안이 아닌, 민간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구성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문화관광위 산하 위원회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한계는 문화관광위 내부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다수의 본회의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논의 결과를 현실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언개연이 국민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한다는 원칙 아래 언론학자, 법학자, 경영학자, 시민단체 대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하부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기한 바 있다. 언개연은 운영위원회 구성시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된 조합주의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또한 박용규 교수(상지대 신방과)는 현업종사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자 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구성원에 포함될 경우 당리당략이 논의에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지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