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여성 대상 폭력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V 뉴스에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가 나오면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도 가해자 혹은 주변 인물들은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을 막는 것은 물론 인터뷰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해 취재 계획을 짠다는 기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7일 ‘제4회 성평등언론실천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수상자 소감 등을 짧은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했다. 성평등언론실천상은 SBS본부가 지난 2022년 말 신설,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SBS 구성원과 콘텐츠에 주는 상으로 인터뷰 공개는 수상자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겪은 고민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카메라 크기, 촬영 구도까지 신경 써…“총보다 카메라가 위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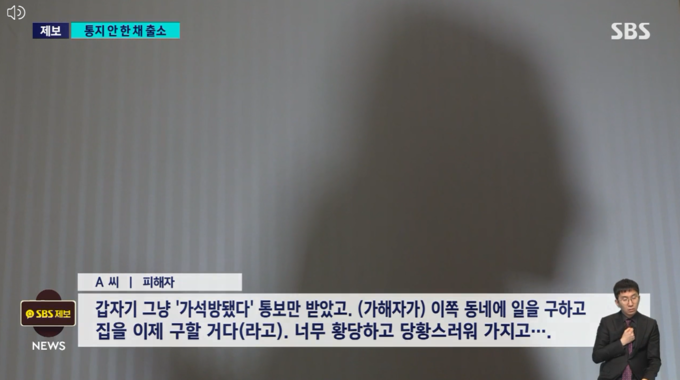
이번 제4회 수상자 중 한 명인 양지훈 SBS 영상취재팀 기자(SBS A&T 방송제작본부 소속)는 공개된 인터뷰에서 “취재가 언제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양 기자는 지난 1월 SBS ‘8뉴스’에서 보도된 <데이트 폭력범 가석방되면 알려 달라 했는데…“이미 출소”> 리포트로 상을 받고 당시 취재 과정을 설명했다.
양 기자는 먼저 “보도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해주시는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걸 가장 신경 썼다”면서 “인터뷰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나 보도 후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특히 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메라부터 바꿨다. 흔히 쓰는 ENG 카메라의 크기가 커 피해자가 공격적으로 느끼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6mm(Z90)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고 “집 안 소품이 노출돼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촬영 구도를 소품이 노출되지 않게 잡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터뷰이의 심적 안정도 신경 쓴 부분이다. 양 기자는 “이번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 비슷한 내용의 취재를 몇 번 한 적 있는데,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취재진 3명, 영상기자, 촬영기자, 오디오맨까지 모두 남성이었다”면서 “좁은 공간에 남성 3명이 몰려 있으면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디오맨은 인터뷰 준비가 끝나면 방 바깥으로 나가게 했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 장소에서 피해자 시야에는 오직 취재기자만 보이게 촬영 구도를 세팅”하기도 했다.

양 기자는 이런 내용이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인터뷰와 관련해 SBS 영상취재팀 내부에 공유되는 촬영 노하우라고 전하며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영상 가이드라인’에는 취재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 등과 관련한 수많은 케이스들이 적혀 있다.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의사항 등에 대해 고민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총과 칼보다 카메라가 더 위협적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직업 특성상 각종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취재가 절대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알’팀 “출연자가 젠더 감수성 떨어지는 발언하면 재촬영하기도”
한편, 올해 상반기 제작·방송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에서 <낙태죄 폐지 5년...방치된 ‘임신중지’>를 다룬 SBS ‘뉴스토리’와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유튜브팀도 같은 상을 받았다.
그알의 도준우 PD는 공개된 인터뷰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해 유튜브 영상 썸네일 제목부터 자막 색깔까지 신경 쓴다고 밝혔다. 도 PD는 “대다수 매체에서 사용한 제목이라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하지 않”고 “자막을 사용할 때 성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 시키는 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뒤집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썸네일은 팀원 전체가 있는 단톡방에 공유해 의견을 나누며 “자극적인 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그는 또 “출연자가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면 재촬영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이건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사실 5년 전 그알 본방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곧바로 피드백이 왔다. 썸네일, 제목, 자막 등을 가지고 곧바로 댓글로 ‘그알은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시청자와 구독자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니 내부에서도 ‘이런 피드백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이후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표현을 체크하는 것이 일종의 룰처럼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반적으로 탐사프로그램이나 보도제작물 등도 이런 기준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