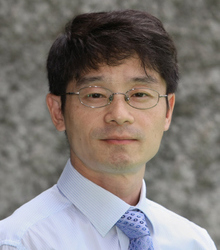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지난 4일 손석희 앵커는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마지막 문장 앞에서 한동안 뒷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다. 25초의 긴 침묵이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줬다. 간신히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손석희와 노회찬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여러 번 만났고, 마음 속으론 친구 같았을 지도 모른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된 앵커 브리핑에서 손석희는 노회찬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픔’을 침묵으로 전달했다.
1994년 성수대교 참사 당시, 겨우 만 1년 된 사회부 경찰기자였다. 그날 오전, 등굣길 버스에 타고 있다 8명이 숨진 무학여고를 찾아갔다.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접촉하려는 신출내기 기자들을, 그때 정년퇴직을 앞둔 여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다 불렀다.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지금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이들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덤덤했다. 미안한 줄도 잘 몰랐다.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이제야 죄송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기자 생활을 막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공감 기능’이다. 기자는 객관적 관찰자여야 하고, 그러기에 냉정해야 하고, 그래서 기뻐도 웃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아야 한다고 은연중 그런 가르침에 젖게 된다. 그 결과, 참사 현장에 가도 본능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 팩트만을 먼저 찾게 된다.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언론의 공감 능력을 요구한다.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언론을 원한다. 언론의 기능이 사실전달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맥락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자연스런 현상이다. 크게는 ‘세월호 참사’가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접하게 되는 ‘언론의 공감’은 극과 극이다. 어떤 기사에서는 무감각에 가까울 정도의 냉정함을, 또 어떤 기사에선 이전엔 잘 접할 수 없었던 기자의 품성과 감정이 잘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전자는 정파성 탓이 크고, 후자는 기사의 폭이 다양해 지면서 허용된 측면이 크다. 뉴스룸에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기자들이 늘어난 것도 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언론이 나아갈 바는 냉정함의 외피 속에 따뜻한 공감의 내피를 여미는 것이라 본다. 손석희 앵커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참고 참았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중요해졌다 하더라도, 언론이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되어선 안 된다. 따뜻한 속은 잃지 않되, 겉은 차가워야 한다. 과거 언론의 잘못된, 그리고 오만한 기자교육은 차가움을 강조하느라, 속까지 얼어붙게 만들곤 했다. 이제 언론은 시민들의 가슴에 닿아야 하고, 그러려면 공감할 줄 아는 언론인이 필요하다.
배우 김혜수는 한 인터뷰에서 “착한 사람이 연기를 잘 하더라”고 했다. 연기란, 해당 인물에 대한 공감과 협업이 바탕이다. 그리고 겸손해야 성장할 수 있다. 기자도 비슷하다. 과거 기자에게 ’착하다’는 말은, 욕이었다. 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젠, 착해야 더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