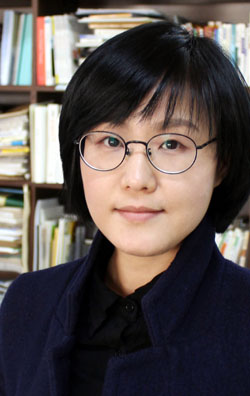 |
||
그러나 충북만의 아름다움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한 듯하다. 서울과 가까운 생활권이지만 충청남도, 경상도, 전라도와도 맞닿아있는 독특함 때문에 이 고장을 따로 조명한 시도는 그리 잦지 않았던 까닭일까.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의 노력은 그래서 더 소중하다. 충북 괴산이 고향인 김 기자는 30여년의 세월 동안 충북의 산하를 떠난 적이 없다. ‘충북토박이’ 기자의 중원의 땅에 대한 사랑과 땀이 배어있는 ‘충북의 전통 탐구 3부작’의 한 장 한 장이 남다른 이유다.
충북 인간문화재의 살 냄새가 물씬한 ‘전통에 말을 걸다’(2010년), 글만 봐도 달큰한 충북 전통술에 살며시 취하게 되는 ‘충북의 전통술’ ‘수을수을 넘어간다’(2012년)에서 이 고장 주요 고택의 아랫목에 몸을 맡겨놓고 싶어지는 ‘산을 닮은 집’(2013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필치를 타고 전해지는 충북의 매력은 세상의 무지를 부끄럽게 만든다.
문화부 시절 느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충북의 구석구석을 찾아가게 했다. 자연을 닮아 순수하지만 자연처럼 무한함을 누릴 수는 없는 인간문화재들, 무관심 속에 조용히 사라져가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무심함은 저널리스트의 사명감을 자극했다. 그가 ‘산을 닮은 집’에서 인용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말처럼 “지나간 것은 현재적인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최소한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김 기자의 충북 탐구는 고고학적이라기보다 인문학적이다. 팩트뿐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게 더 큰 미덕이다. 그는 겸양을 잃지않으며 설명한다. “저는 전통 유산을 학문으로 해석할 만큼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보다 제 관심은 그것에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깃들어있나 하는 것이었죠.”
지역신문의 핵심 출입처인 도청을 담당하는 중견 기자에게 충북의 전통을 취재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꿀맛같은 주말과 업무 후 시간은 고스란히 이 작업에 투자됐다. 그래도 “발굴되지 않은 충북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나가는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김 기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 그가 알듯 모를 듯한 힌트를 준다. “그거 아세요? 충북은 ‘육지의 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는 땅, 충북에도 어민들은 삶을 잇고 있다. 대청호, 청풍호, 충주호, 괴산호 등 바다 못지않은 넉넉한 호수들이 멋들어진 청풍명월의 고장이다. 이제 김정미 기자가 내륙 어민들의 눅진한 삶을 그릴 ‘충북 전통 4부작’이 기다려진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