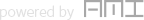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
||
| ▲ 영남일보 이춘호 기자 | ||
거리의 악사, 영남일보 이춘호 기자는 오늘도 대구시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섬집 아기’를 부른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거의 없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대구의 호젓한 공원과 거리를 찾아 늦은 밤 홀로 동요 콘서트를 연다. 낮 동안 뜨겁게 달구어진 도시는 그의 노래와 함께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이춘호 기자는 동요 가수다. 단순히 동요를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기 콘서트를 열고 음반을 낸 정식 가수다. 그는 지난달 하순에 사비를 털어 생에 첫 동요 음반인 ‘바람난 동요’를 냈다. 음반에는 ‘섬집 아기’, ‘과꽃’, ‘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등 11곡이 실렸다.
그가 노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중3 때 기타를 치면서부터다. 이 기자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 가요제에 나갔지만 당시 심사위원이던 작곡가 정풍송씨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지 않느냐.” 노래를 못 부르는 이들이 가요제에 나오니 심사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였다. 이 기자는 “이 말이 20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다”며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건 아마도 이 사건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나이 마흔에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IMF 사태로 사회가 스산한 때였다. 그는 노래로 위로를 찾으려 했다. 매일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을 들고 대구 시내 한 산에 올라, 기타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오전 마감을 끝낸 오전 11시부터 오후 4~5시까지, 1년 이상 노래와 옥타브 연습을 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카페에 무작정 들어가 노래를 불렀는데 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러나 이곳에서 지금까지 연을 맺고 정식 가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준 신촌블루스의 객원가수 신재형씨를 만났다. 그 뒤로 가수 출신 친구들을 여럿 사귀었고 이들과 모임을 결성해 식당과 거리 곳곳에서 20여 차례 노래를 불렀다.
그는 2000년 9월 경북 청도 비슬문화촌에서 연 ‘비쓸락(비오는 날 쓸쓸한 사람들을 위한 樂) 게릴라 콘서트’를 데뷔 무대로 기억했다. 그때 오프닝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섬집 아기’이다. 비쓸락 콘서트는 20여 명이 모인 작은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10년 넘게 매월 개최해오면서 이제는 3백여 명이 모이는 대구의 명물이 됐다. 그는 “처음엔 발라드와 외국곡도 불렀지만 점차 동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며 “1백20여 곡의 동요악보를 손수 구하고 매월 레퍼토리도 바꾸면서 자연스레 동요전문 가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팬들도 제법 있는 유명인이다.
이 기자는 동요가 현대인들에게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KBS, MBC 어린이 합창단이 유명무실해진 데다가 아이들도 교육가도 정치인도 모두 동요에 관심이 없더라며 스스로 ‘동요 지키미’가 되기로 한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제주도에서 처음 개최한 ‘동요끈잇기 국토대장정’ 콘서트는 이 때문에 기획됐다. 전국 30여 군데 동요 사각지대를 돌며 콘서트를 열고 동요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림과 동시에 동요 지키기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다. 2년이 걸리는 ‘말 그대로’ 대장정이다. 그는 마지막 개최지는 임진각이나 국회의사당 앞뜰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춘호 기자는 사실 10여 년 동안 향토음식을 연구하고 다양한 시리즈물을 쓰는 한편 대구의 음식역사 1백년을 정리, 4백여 쪽의 책도 낸 바 있는 음식전문기자다.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다. 지금도 KBS에 출연 중이다.
그는 음식전문기자로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지만 동요를 부르는 거리의 악사가 될 때는 철저히 가수의 역할에만 충실하려 한다. 20년 동고동락해온 빨간 마티즈에 스피커와 기타 등 간단한 장비만 챙겨 전국을 누빈다. 하반기 그의 목표는 서울 대학로나 홍대, 서울역에서 기습 콘서트를 여는 것이다. “우연한 계기로 동요가수가 되었지만 저의 작은 노력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동요에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