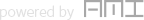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
||
부산일보 이진원 기자(47)는 올해로 23년째 교열기자로 일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진주와 마산에 있던 ‘경일신문’과 ‘동남일보’에서 교열기자 일을 시작, 199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일보 기자로 지내고 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우리말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펴냈다.
그의 책 ‘우리말에 대한 예의’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필독서로 꼽힌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4월8일 부산일보 한 코너로 시작해 간판 칼럼으로 자리 잡은 ‘이진원 기자의 바른말 광’ 연재의 결과물이다.
이 시리즈의 칼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화제를 낳았지만 지난해 2월24일 부산일보에 게재된 ‘좋은 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글이 특히 눈에 띈다. 그는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읽는 사람이야 읽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욕이 느껴진다. 설득하고 이해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자를 소개하는 코너이기보다는 비평에 가깝다. 그는 그 이유를 “좀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칼럼에서 다른 이들의 글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이지만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다. ‘우리말에 대한 예의’의 출간 반년이 지난 시점에 한 여성독자가 “작은따옴표의 위치가 이상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온 것. 그는 “실제로 몇 자 뒤에 찍어야 할 작은따옴표가 앞쪽에 잘못 찍혀 있더라”며 “모골이 송연했다”고 털어놓았다.
우리말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은 교열기자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부산대 공대에 입학했던 그는 이듬해 재수를 해 같은 대학 국문과에 재입학했다. 대학에서 당시 교열기자로 근무하던 선배를 만난 것도 이 길로 들어선 연으로 이어졌다. 이 기자가 “교열기자는 내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다.
일상에서 잘못 쓰는 다양한 표현을 소개하려면 ‘성실과 부지런함’이 필수다. 이 기자가 스크랩 ‘광’인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가 1988년 경일신문 수습기자 시절부터 우리말 관련 내용을 모은 것이 대학노트로 19권이나 된다. 길을 걷다가도, 말하다가도, 칼럼 소재를 찾아내 주변으로부터 “직업병”이라는 핀잔을 자주 듣는다.
글과 생을 함께하고 있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고려시인 정지상의 한시 ‘송인(送人)’이다. 이 시의 한 구절인 ‘별루연연첨록파(別淚年年添綠波)’는 그의 블로그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상선약수’라는 글귀도 좋아한다. 이 기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이 말은 ‘흐르는 물처럼 살라’는 가르침일 것”이라며 “자연스레 흐르는 물을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좋게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조금 더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내용의 광고 카피를 인용하며 일선 기자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당부했다. “갈수록 약해지는 교열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앞세워 교열을 없애기까지 하는 게 우리나라 신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자 한 자가 신문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