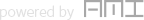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관영 회귀하면 경영개선 환상에서 비롯”
“최근 편집국장 직선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장단을 끈질기게 고민해서 나온 산물이라기 보단, 정권의 바람대로 직선제를 없애면 경영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일부 사원, 경영진의 기대와 환상에서 비롯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서울신문 A기자)
서울신문의 편집국장 직선제가 폐지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일개 회사의 일이 아니라 언론의 편집권 독립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서울신문 편집국장 직선제의 탄생 역사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서울신문의 편집국장 직선제는 지난 1998년 소유구조 개편 논의 도중 화두로 떠올랐다. DJ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위상 재정립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서울은 제호를 ‘대한매일’로 교체하고 관영언론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직선제는 제호 변경과 동시에 서울이 독립 언론으로 탈바꿈된다는 의미였다.
2000년 10월18일 서울신문은 노사합의로 ‘제한적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소유구조 개편, 경영혁신, 지면혁신을 골자로 하는 ‘대한매일의 새 출발을 위한 노사합의문’을 체결하며 직선제 도입을 타결했다. 그 당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던 곳은 경향신문, 부산일보, 한겨레 등 단 3곳이었다.
2000년 11월 최홍운 초대 직선 편집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제1070호)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을 편드는 편파보도를 하면서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제호를 변경하며 이미지를 쇄신하려했으나 미흡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익정론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추천제였던 제한적 직선제가 직선제의 애초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선투표제’라는 지금의 형태로 재정립됐다.
우여곡절 끝에 직선제가 제도화됐으나 경영진의 폐지 시도와 편집권 침해 시비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 2007년 노진환 전 사장이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의 기사를 빼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노조의 거센 항의가 일었다. “직선제가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경영진 뜻대로 편집국장을 앉힌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최근 서울신문이 편집국장 직선제를 놓고 내홍에 휩싸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10년 동안 직선제를 실시했으나 편집국의 계파 갈등은 심화됐고 편집국과 비 편집국 간 소통 부재 상황도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젊은 기자들은 직선제 폐지의 근본 논리는 관영언론으로의 회귀가 경영난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편집국 한 기자는 “제도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편집권 독립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결국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최근 편집국장 직선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장단을 끈질기게 고민해서 나온 산물이라기 보단, 정권의 바람대로 직선제를 없애면 경영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일부 사원, 경영진의 기대와 환상에서 비롯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서울신문 A기자)
서울신문의 편집국장 직선제가 폐지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일개 회사의 일이 아니라 언론의 편집권 독립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서울신문 편집국장 직선제의 탄생 역사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서울신문의 편집국장 직선제는 지난 1998년 소유구조 개편 논의 도중 화두로 떠올랐다. DJ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위상 재정립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서울은 제호를 ‘대한매일’로 교체하고 관영언론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직선제는 제호 변경과 동시에 서울이 독립 언론으로 탈바꿈된다는 의미였다.
2000년 10월18일 서울신문은 노사합의로 ‘제한적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소유구조 개편, 경영혁신, 지면혁신을 골자로 하는 ‘대한매일의 새 출발을 위한 노사합의문’을 체결하며 직선제 도입을 타결했다. 그 당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던 곳은 경향신문, 부산일보, 한겨레 등 단 3곳이었다.
2000년 11월 최홍운 초대 직선 편집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제1070호)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을 편드는 편파보도를 하면서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제호를 변경하며 이미지를 쇄신하려했으나 미흡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익정론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복수추천제였던 제한적 직선제가 직선제의 애초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선투표제’라는 지금의 형태로 재정립됐다.
우여곡절 끝에 직선제가 제도화됐으나 경영진의 폐지 시도와 편집권 침해 시비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 2007년 노진환 전 사장이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의 기사를 빼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노조의 거센 항의가 일었다. “직선제가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경영진 뜻대로 편집국장을 앉힌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최근 서울신문이 편집국장 직선제를 놓고 내홍에 휩싸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10년 동안 직선제를 실시했으나 편집국의 계파 갈등은 심화됐고 편집국과 비 편집국 간 소통 부재 상황도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젊은 기자들은 직선제 폐지의 근본 논리는 관영언론으로의 회귀가 경영난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편집국 한 기자는 “제도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편집권 독립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결국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