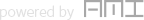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퉈 전문기자, 그러니까 ‘전문가이자 기자인 사람’을 초빙한다고 한다. 이 전문기자를 만드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박사 등 이미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하는 기자들에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전문기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언론사에서는 첫째 방법을 주로 썼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기자제를 실시한 한 신문사의 예에서 이런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94년 박사들을 대거 전문기자로 채용했지만 상당수가 신문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다. 한 젊은 박사는 기자로서의 수련을 하라고 사회부 경찰팀에 배치했더니 1주일도 되지 않아 그만뒀다고 한다. 그들은 전문가이기는 했으나 기자가 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게 기사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다른 기자가 쓴 것을 보니 큰 기사더라”는 한 전문기자의 초창기 고백에서 보듯 기자로서의 감각 부족으로 인해 “전문기자는 ‘기사용’이라기보다 박사들을 기자로 뽑았다는 ‘홍보용’”이라는 말마저 한 때 나돌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뽑은 전문기자 중에 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전문기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게 중론이고 보면 그들을 뽑은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터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기자를 만드는 둘째 방법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특정 분야를 오래 취재하며 준 전문가가 된 기자들에게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주고 전문기자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전문기자는 국내에 몇명 없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했다. 한 신문사의 북한문제 전문기자-공식 호칭은 ‘전문위원’이다-가 그 좋은 예다. 그는 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때 혼자 신문 여섯면을 메꿔내는 괴력을 선보였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듬해 전문기자가 됐다. 그가 훌륭한 전문기자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부에서 북한 관련 취재를 맡는 동시에 그 신문사의 북한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자들에게 전문성을 계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전문기자를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물론 기자를 전문가로 키워내는데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많은임금을 주고 전문가를 기자로 초빙했는데 막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자들에게 투자하는 쪽이 결코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얼마 전 두 신문사가 자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자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현명한 조치를 한 것이기에 환영할 만하고 또 기자들로서는 장래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고서 “내부에서 전문기자를 뽑았더니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일이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지금까지 국내 언론사에서는 첫째 방법을 주로 썼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기자제를 실시한 한 신문사의 예에서 이런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94년 박사들을 대거 전문기자로 채용했지만 상당수가 신문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다. 한 젊은 박사는 기자로서의 수련을 하라고 사회부 경찰팀에 배치했더니 1주일도 되지 않아 그만뒀다고 한다. 그들은 전문가이기는 했으나 기자가 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게 기사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다른 기자가 쓴 것을 보니 큰 기사더라”는 한 전문기자의 초창기 고백에서 보듯 기자로서의 감각 부족으로 인해 “전문기자는 ‘기사용’이라기보다 박사들을 기자로 뽑았다는 ‘홍보용’”이라는 말마저 한 때 나돌았다고 한다.
물론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뽑은 전문기자 중에 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전문기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게 중론이고 보면 그들을 뽑은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터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기자를 만드는 둘째 방법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특정 분야를 오래 취재하며 준 전문가가 된 기자들에게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주고 전문기자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전문기자는 국내에 몇명 없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했다. 한 신문사의 북한문제 전문기자-공식 호칭은 ‘전문위원’이다-가 그 좋은 예다. 그는 94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때 혼자 신문 여섯면을 메꿔내는 괴력을 선보였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듬해 전문기자가 됐다. 그가 훌륭한 전문기자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부에서 북한 관련 취재를 맡는 동시에 그 신문사의 북한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자들에게 전문성을 계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전문기자를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물론 기자를 전문가로 키워내는데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많은임금을 주고 전문가를 기자로 초빙했는데 막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자들에게 투자하는 쪽이 결코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얼마 전 두 신문사가 자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자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현명한 조치를 한 것이기에 환영할 만하고 또 기자들로서는 장래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고서 “내부에서 전문기자를 뽑았더니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일이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