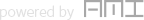외환 위기 이후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가 이제 언론계에도 스며들고 있다. 한국일보에서는 기자들이 노조를 탈퇴하면서까지 연봉제를 받아들이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현 급여의 두 배를 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언론사마다 경영진들은 이를 세계적 추세니 대세니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언론사의 연봉제 실시는 시기상조다. 무엇보다도 연봉제 도입의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연봉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평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피평가자의 연봉이 인사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공정하고 정밀하지 못한 평가수단으로는 누구나 승복할 수 없게 된다.
외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연봉제를 가다듬은 결과 다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피평가자 본인의 자체 평가와 상급자의 1차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가 상급자를, 동료가 다른 동료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도 답하기 골치아플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만약 평가가 피평가자의 자체 평가와 크게 다르면 절차를 밟아 소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것도 특기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사들이 이 정도로 준비된 평가제도를 갖추고 연봉제를 실시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의 자세다. 만일 외국처럼 완벽한 제도를 갖췄다고 해도 상명하복, 도제식 직무교육, 연공서열, 주먹구구식 인사관리와 회계체계, 괘씸죄의 횡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풍토에서 연봉제가 제자리를 잡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이 모든 점이 해결돼 연봉제가 정착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예컨대 보도된 기사량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면 기사 작성이 질보다 양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언론계의 아름다운 전통인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와 동료들 간의 협동정신이 파괴되는 것도 또다른 부작용이다. 연봉제가 실시되는 회사는 각 개인의 연봉은 최고 경영자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부쳐진다. 또한 연봉제는 대개 총량이 정해진 가운데 특정인은 더 주고 다른 누군가는 덜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주변의 동료, 선후배는 동지가 아닌 연봉 경쟁자일 뿐이다. 여기에다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취재를 해도 경영진의마음에드는 성과가 없으면 가차 없이 해고를 당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로 도입하고 싶은 유혹을 억제하기 힘들지만, 기자들은 경영진과 업무의 노예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연봉제 대세론이 언론계에 퍼져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한국일보에서는 궁핍한 현실을 이유로 연봉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우리 기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다수가 거부하는 대세는 있을 수 없다. 대세론의 패배의식을 버린다면 시기상조의 연봉제는 막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언론계에 연봉제는 시기상조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언론사마다 경영진들은 이를 세계적 추세니 대세니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언론사의 연봉제 실시는 시기상조다. 무엇보다도 연봉제 도입의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연봉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평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피평가자의 연봉이 인사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공정하고 정밀하지 못한 평가수단으로는 누구나 승복할 수 없게 된다.
외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연봉제를 가다듬은 결과 다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피평가자 본인의 자체 평가와 상급자의 1차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가 상급자를, 동료가 다른 동료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도 답하기 골치아플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만약 평가가 피평가자의 자체 평가와 크게 다르면 절차를 밟아 소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것도 특기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사들이 이 정도로 준비된 평가제도를 갖추고 연봉제를 실시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의 자세다. 만일 외국처럼 완벽한 제도를 갖췄다고 해도 상명하복, 도제식 직무교육, 연공서열, 주먹구구식 인사관리와 회계체계, 괘씸죄의 횡행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풍토에서 연봉제가 제자리를 잡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이 모든 점이 해결돼 연봉제가 정착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예컨대 보도된 기사량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면 기사 작성이 질보다 양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언론계의 아름다운 전통인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와 동료들 간의 협동정신이 파괴되는 것도 또다른 부작용이다. 연봉제가 실시되는 회사는 각 개인의 연봉은 최고 경영자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부쳐진다. 또한 연봉제는 대개 총량이 정해진 가운데 특정인은 더 주고 다른 누군가는 덜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주변의 동료, 선후배는 동지가 아닌 연봉 경쟁자일 뿐이다. 여기에다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취재를 해도 경영진의마음에드는 성과가 없으면 가차 없이 해고를 당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로 도입하고 싶은 유혹을 억제하기 힘들지만, 기자들은 경영진과 업무의 노예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연봉제 대세론이 언론계에 퍼져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한국일보에서는 궁핍한 현실을 이유로 연봉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우리 기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다수가 거부하는 대세는 있을 수 없다. 대세론의 패배의식을 버린다면 시기상조의 연봉제는 막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언론계에 연봉제는 시기상조다.
편집국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