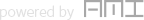김택환 언론재단 책임연구원
1994년 7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김 주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한반도에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시대적 요청과 남북한 정치권력의 필요성으로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상호 합의하는 역사적 진전을 맛보게 되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go and stop’으로, 정치권력의 목적에 따라 협상의 진전과 결렬이 있었다. 즉 집권층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치적 권력의 이해와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함으로써 민족적·평화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언론 역시 이것에 복무하는 행태를 보였다.
1989년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동독 인민의 힘으로 무너지면서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달성했다. 동서독 정상의 만남은 이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3월 19일 에어프르트에서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와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당시 언론의 보도 태도는 동서독 언론 공히 양 수상의 역사적 만남을 평가했다. 또한 동독 언론은 서독과 국제적으로 같은 위상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서독의 언론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화해와 협력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1972년 동서독은 ‘언론인의 활동 자유 및 보도행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간의 상호 언론 특파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서독의 특파원들은 동독의 인권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보다는 일상적·현실적 동독 주민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물론 20년 동안 4명의 서독 특파원이 동독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지만, 서독 언론은 기본적으로 1970년 상호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본 노선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동서독 간의 상호 파악과 이해 그리고 동질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요한 것은 상호 자유로운 TV시청이었다. 서독 주민들은 동독의 경제수준을 알고 있었고, 동독 주민 역시 서독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과 개혁 및 개방 정책은 바로 동서독 통일의 점화선 역할을 했다.
80년대이미서독의 동독체제에 대한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서독 언론은 동독 국민들의 정보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한다는 방송보도 프로그램 준칙까지 만들어 실천하는 인내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양 독일인간의 상호 이해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동독 인민의 궐기, 국제 정세, 서독 정치권의 발 빠르고 현명한 대처, 언론의 역할 등으로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달성했다.
이제 한반도는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언론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냉전적, 반통일적 태도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는 상상력과 지혜의 부족으로 역사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민족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특히 인간과 언론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인권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언론 본연의 자세가 충돌하기보다는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택환의 전체기사 보기
1994년 7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김 주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한반도에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시대적 요청과 남북한 정치권력의 필요성으로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상호 합의하는 역사적 진전을 맛보게 되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go and stop’으로, 정치권력의 목적에 따라 협상의 진전과 결렬이 있었다. 즉 집권층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치적 권력의 이해와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함으로써 민족적·평화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언론 역시 이것에 복무하는 행태를 보였다.
1989년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동독 인민의 힘으로 무너지면서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을 달성했다. 동서독 정상의 만남은 이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3월 19일 에어프르트에서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와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당시 언론의 보도 태도는 동서독 언론 공히 양 수상의 역사적 만남을 평가했다. 또한 동독 언론은 서독과 국제적으로 같은 위상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서독의 언론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화해와 협력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1972년 동서독은 ‘언론인의 활동 자유 및 보도행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간의 상호 언론 특파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서독의 특파원들은 동독의 인권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보다는 일상적·현실적 동독 주민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물론 20년 동안 4명의 서독 특파원이 동독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지만, 서독 언론은 기본적으로 1970년 상호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본 노선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동서독 간의 상호 파악과 이해 그리고 동질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요한 것은 상호 자유로운 TV시청이었다. 서독 주민들은 동독의 경제수준을 알고 있었고, 동독 주민 역시 서독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과 개혁 및 개방 정책은 바로 동서독 통일의 점화선 역할을 했다.
80년대이미서독의 동독체제에 대한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서독 언론은 동독 국민들의 정보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한다는 방송보도 프로그램 준칙까지 만들어 실천하는 인내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양 독일인간의 상호 이해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동독 인민의 궐기, 국제 정세, 서독 정치권의 발 빠르고 현명한 대처, 언론의 역할 등으로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달성했다.
이제 한반도는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언론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냉전적, 반통일적 태도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는 상상력과 지혜의 부족으로 역사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민족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특히 인간과 언론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인권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언론 본연의 자세가 충돌하기보다는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택환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