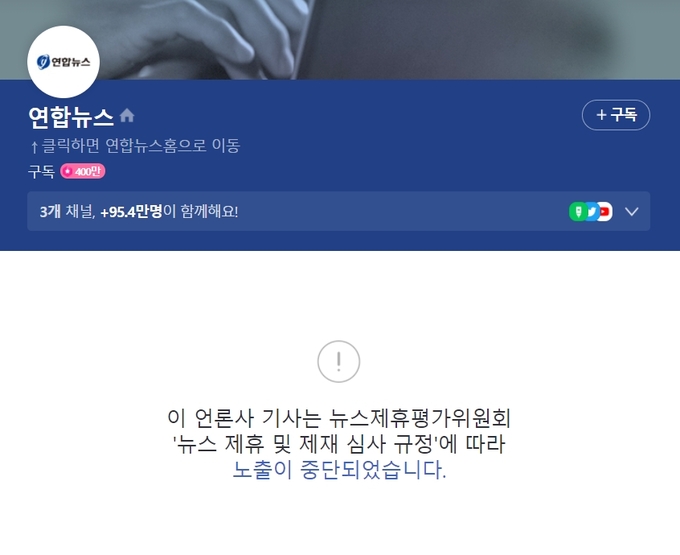
연합뉴스 콘텐츠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사라졌다. 연합뉴스가 돈을 받고 쓴 광고기사를 일반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32일간 노출 중단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다음의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2015년 출범한 이후 콘텐츠제휴 언론사에 한 달이 넘는 노출 중단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독자를 기만한 저널리즘 윤리 문제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 포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고민, 탈포털 시도 등 국내 언론계에 여러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양대 포털에서 기존 연합뉴스 기사 링크로 접속하면 ‘제평위 규정에 따라 노출이 중단됐다’는 문구만 뜬다. 32일 노출 중단 징계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고, 네이버 모바일 연합뉴스 언론사편집판도 막힌 상태다. 네이버 PC 화면의 연합뉴스 속보창은 다른 언론사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
중단 1주일 만에 구독자 22만 감소... 타 매체들, 독자 끌어오려 속보 강화
노출 중단이 시작되자 연합뉴스 내부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연합뉴스의 한 평기자는 “구체적인 공지가 없어서 노출이 중단되고 나서야 과거 기사까지 사라진다는 걸 알았다”며 “사원들이 항의해도 매일 내려오는 주문은 ‘이럴 때일수록 기사를 더 써야 한다’ 뿐이다. 경영진과 사업부서가 한 잘못을 기자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출 중단 당일 연합뉴스 노조도 성명에서 “제재의 원인이 오롯이 연합뉴스의 잘못이라는 점에 반성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충격파에 더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일선에서 체감하는 대책이나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수면 위로 떠오른 기사형 광고 문제에 “업계의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사이 내부 대책 마련엔 소극적이었다. 이 사안이 제평위 제재소위 안건으로 오르고 실제 징계가 가시화하자 지난달 18일 당시 조성부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반 기사로 둔갑한 광고형 기사는 언론사가 독자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포털이라는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언론사 한 곳의 문제를 넘어 언론계 전반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연합뉴스는 연간 300억원의 정부구독료를 받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이번 사안은 비즈니스가 아닌 저널리즘 윤리 문제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포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온 연합뉴스가 ‘다들 하는데 재수 없게 걸렸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에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합뉴스를 관리·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언론사의 부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주체가 제평위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사이트 강화의 좋은 시험대... “네이버 중단을 전략 다각화 기회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일단 기사형 광고엔 일시적으로나마 경고등이 커졌다. 한 경제매체 관계자는 “기사형 광고로 매년 수억원대 매출을 내왔는데 연합뉴스 사태 이후 내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없는 한 달이 향후 포털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당장은 포털 뉴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연합뉴스 소비층이 어느 언론사로 쏠릴지 또는 고르게 분산될지가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네이버 구독자 수는 노출 중단 전날인 지난 7일 434만명대에서 14일 기준 412만명대로 일주일 만에 22만명가량이 빠진 상태다. 일부 언론사는 연합뉴스의 강점인 속보를 기대하는 뉴스 이용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일선 기자들에게 속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징계의 원인을 떠나 연합뉴스의 강제 퇴장은 최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탈포털·자체 사이트 강화 드라이브와 맞물려 언론-포털 관계를 되짚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공식 취임하는 성기홍 연합뉴스 신임 사장은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8일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000년대 포털이 생겨난 이후 연합뉴스는 속보를 원하는 포털의 뉴스 유통 공간을 그냥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며 “포털은 현재 뉴스를 유통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노출 중단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다각화하고 포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포털 관점에서 다른 언론사들도 연합뉴스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대형 언론사 디지털부문 간부는 “포털에 종속된 언론은 제평위의 평가 잣대 하나로 단칼에 나가떨어지는 상황이고 언젠가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언론사 스스로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든 포털을 나간다는 상상을 쉽게 하지 못했는데, 연합뉴스 사태와 다른 언론사들의 탈포털 움직임을 보면서 포털을 통한 뉴스가 사라질 때를 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