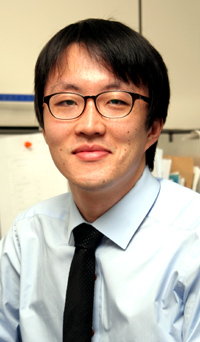 |
||
| ▲ 원성윤 기자 | ||
이 같은 노동 강도를 입증하듯 조선일보를 떠나는 기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5명, 2011년 11명, 2012년 13명으로 지난 3년간 조선에 사표를 낸 기자들은 총29명으로 확인됐다. 차장급 기자부터 주니어 기자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한 기자는 “매일 밤12시 넘어서까지 회사에 대기를 해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했다.
지난해 부활한 가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자 일선 기자들과 간부들이 노보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기자는 노보에 “삶이 없다. 못 다니겠다. 줄 퇴사를 보라”며 회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미디어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문이 더 분발해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끝에 조선 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올해가 돼서야 타결했다. 새 집행부가 맡아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회사 측에 임금안을 일임했고 동결됐다. 대신 연봉총액 기준 2~3%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기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경영진에게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하기 어렵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노조 사무국장이 80일째(30일 현재) 공석 상태다. 기자들이 노조 전임자로 파견가는 것을 일종의 ‘무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제19대 사무국장 자리가 9일간 공석이었던 적을 제외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무국장을 맡아야 할 기수는 수십일 간의 공석 끝에 바로 아래기수들에게 직을 떠넘겼다. 그러자 아래기수는 위기수에게 “후배라고 마냥 떠맡을 수만은 없다”며 다시 떠넘겼다. 몇 해 전 노조 사무국장을 맡은 한 기자는 노보를 통해 “조선일보 기자로서 받는 월급에는 노동의 대가인 동시에 노조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가 포함된 것”이라고 후배들을 질타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1등 신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보여주는 의식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아쉽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